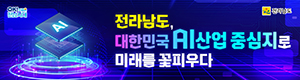|
茶後小詠
다후소영
차를 마시고 나서 작게 읊다.
- 이색(李穡, 1328 ~ 1396)
小甁汲泉水
소병급천수
작은 병에
샘물 길어
破鐺烹露芽
파당팽로아
깨진 솥에
노아차를 끓이누나.
耳根頓淸淨
이근돈청정
귓속 갑자기
말끔해지고
鼻觀通紫霞
비관통자하
코끝엔 붉은
노을이 통하여라.
俄然眼翳消
아연안예소
잠깐 새에
눈 흐림도 사라져
外境無纖瑕
외경무섬하
조그만 티도
외경에 보이질 않네.
舌辨喉下之
설변후하지
혀로 맛 분별하여
목으로 삼키면
肌骨正不頗
기골정불파
기골은 정히
평온해진다네.
靈臺*方寸地*
령대*방촌지*
방촌의 마음
신령스러워
皎皎思無邪
교교사무사
생각에는 조금의
삿됨도 없어라.
何暇及天下
하가급천하
어느 겨를에
천하를 언급하랴
君子當正家
군자당정가
군자는 의당
집을 바로 잡아야지.
* 靈臺(영대) : 신령스럽다는 뜻으로, 마음을 이르는 말
* 方寸地(방촌지) : 사방 한 치(寸)의 공간. 매우 좁은 공간.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. 심장이 가슴의 한 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. 방촌지(方寸地)라고도 한다.
출전 : 『목은시고』 권 6
이색(李穡, 1328 ~ 1396)
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. 자는 영숙(穎叔), 호는 목은(牧隱), 시호는 문정(文靖).
공민왕 때 문하시중을 지냈으며,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.
고려 말 삼은(三隱)의 한 사람으로서 고려의 멸망과 함께 은둔하였다.
저서로 “목은문고(牧隱文藁)”, “목은시고(牧隱詩藁)” 등이 있다.
이색은 포은(圃隱) 정몽주(鄭夢周), 야은(冶隱) 길재(吉再)와 함께 고려의 삼은(三隱)으로 일컬어진다.
문하에 권근, 변계량 등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하여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.
배진희 기자 news@presszon.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
 2025.11.20 (목) 09:19
2025.11.20 (목) 09:19